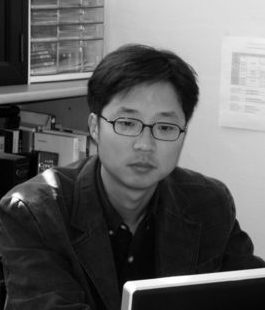|
||||||
기실 다문화라는 말은 이미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와 같은 이주민들로 구성된 사회에서 백년 넘게 다루어져 온 주제이며, 그럼에도 여전히 민족적·인종적·계급적 갈등과 차이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다. 또 다문화주의 이면에 각기 다른 종교와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고, 식민지배를 가한 나라의 문화와 겪은 나라의 문화, 정복한 백인의 문화와 정복당한 원주민의 문화가 각기 등가의 ‘문화’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 사회는 마치 ‘외국인 몇 명 시대가 도래했다’는 식으로 ‘새마을 운동’ 하듯이 다문화화를 추진하고 있다. 얼마 전 프랑스 공립학교에서 히잡을 쓴 학생들의 등교를 막아 문제가 되었는데, 이는 다양성을 주창하면서도 다양성을 그 사회에 접합시키지 못한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다.
문화는 본질적으로 다양성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문화는 ‘다문화’적이다. 다만 그동안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 다양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따름이다. 하지만 우리들의 인식 속에는 우리 사회의 ‘베트남 문화’, ‘파키스탄 문화’가 들어와 아오자이를 입은 베트남 여성들이 이 사회를 활보해야 그것을 다문화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생각해 보면 한국 문화에서도 갓 쓰고 도포 입고 치마저고리 입는 시대는 진작 지나지 않았는가.
이주민들이 한국 사회로 오는 건 단적으로 말해 ‘경제적’ 이유에서다. 먹고살기 위해 한국으로 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로 통칭되는 지구화 속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이동을 국경으로 제한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 가운데 불법체류자를 향한 살인적인 단속과 불합리한 노동환경, 피폐해진 농업정책과 인신매매적 국제결혼이 성행하고 있다. 그중에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저가의 노동력을 활용하고 사람들의 이동을 통해 이익을 내는 사람들이다. 지금 한국에서 다문화란 인간을 이윤의 관점에서만 보는 ‘전지구적 자본주의’와 ‘그 가운데 생존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문화’의 만남이지, 결코 ‘한복’과 ‘아오자이’의 만남이 아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다문화화는 이런 경제중심적인 문화를 ‘인간 중심의 문화’, ‘함께 상생하는 경제’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 ‘다문화화’가 이국적인 것에 대한 호기심이나 외적인 다양성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그나마도 아직 ‘단일민족’ 운운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지만 말이다.
이종민/포천나눔의집 이주노동자 상담소장
[한겨레 2007-10-30]
'* 역사 > TransKorean'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를 위한 음악회 (0) | 2009.06.25 |
|---|---|
| 이주노동자 정책_브런슨 매킨리 (0) | 2009.06.25 |
| 이주 노동자 상호 인정 협정_일자리 창출’나선 ILO 아·태총회 (0) | 2009.06.25 |
| 시베리아 원주민의 역사 / 저자 제임스 포사이스 | 역자 정재겸 | 출판사 (0) | 2009.06.25 |
| 필리핀의 이주역사 (0) | 2009.06.25 |